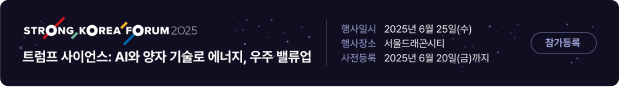메타가 AI 스마트 안경에 얼굴인식 기능 도입을 추진하며, 기술 진보와 사생활 침해, 사회적 신뢰의 균형에 대한 철학·공학·윤리적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기술은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확장하며, 기억과 인식의 능력을 외부 장치에 위임하는 새로운 문명을 열었다. 스마트 안경의 AI 기반 얼굴인식 기능은 인간의 기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기억’이라는 인간적 경험이 더 이상 개인의 고유한 것이 아님을 시사하며, 기술이 인간 정체성의 경계와 프라이버시의 의미를 재정의하게 한다. 메타는 초기 스마트 안경에는 얼굴인식 기능 도입을 보류했으나, 최근 적극적으로 해당 기술을 착용형 기기에 적용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슈퍼 센싱(super sensing)’으로 불리는 이 기능은 AI가 주변 인물의 얼굴을 스캔하고 이름을 식별하는 기술이다. 기존 Ray-Ban Meta 안경은 영상 촬영 시 표시등이 켜지지만, 향후 슈퍼 센싱 모드에서는 표시등 사용 여부마저 재검토되고 있다. 기술적으로 이는 실시간 얼굴인식, 고효율 AI 연산, 배터리 지속성 등 여러 공학적 도전과 발전이 집약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기술은 개인의 일상적 프라이버시와 집단적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사용자 본인의 선택과 달리, 주변인의 얼굴 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분석될 수 있다. 윤리적으로는 감시와 동의, 데이터 남용 가능성, 프라이버시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경계 문제 등이 제기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은 기술 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실제 메타는 2024년 4월 자사 스마트 안경의 AI 기능을 기본값으로 활성화하고,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 수집에 대한 선택권도 제한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최근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규제 공백이 기술 확산을 가속할 우려가 있다. 구글 글래스 사례에서 확인된 사회적 반발(‘글래스홀’ 논란)은 여전히 유효하며, 메타 역시 표시등 등 프라이버시 보호장치의 유지 여부 논쟁에 직면해 있다. 향후 기술 발전은 더욱 정교한 센싱과 장시간 데이터 수집을 가능케 할 전망이다. 이는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 프라이버시 기준, 법적·윤리적 규범의 재정립을 촉구한다. 기술과 사회의 신뢰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기억’과 ‘관계’의 의미가 어떻게 변모할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태그: AI, 얼굴인식, 프라이버시, 스마트안경,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