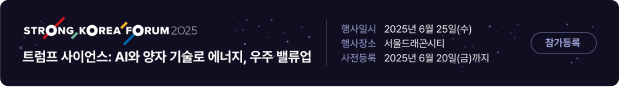AI를 특별한 위험 혹은 초지능적 존재로만 인식하는 시선을 넘어, 일상적 기술로 받아들이는 철학적·사회적 전환이 요구된다.
우리는 AI를 여전히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영화 속 초지능, 혹은 통제 불능의 실체로서의 AI가 익숙하다. 하지만 기술은 결국 인간 삶의 확장된 도구다.
철학적으로 AI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인간의 사고·창의·판단을 확장하는 ‘일상적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인문학적으로도 AI는 더 이상 ‘미래의 산물’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언어·문화·예술에 스며든 ‘현재의 풍경’이다. 기술을 신화화하거나 악마화하는 태도 대신, 우리의 일상과 정체성에 어떻게 녹아드는지 성찰해야 할 시점이다. 현실에서 AI는 점점 더 다방면에 적용되고 있다.
생성형 모델, 추천 알고리즘, 자동화 시스템 등은 이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일상에 녹아들었다. 공학적으로 보면 AI는 빅데이터, 신경망, 강화학습 등 복잡한 원리 위에 구축되어 있으나, 그 작동 방식은 ‘특별하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 발전의 연장선이다.
AI가 슈퍼지능으로 진화한다는 담론도 있지만, 실제로는 제한적 데이터와 인간의 가치 판단에 크게 의존한다. AI를 우라늄이나 핵무기처럼 특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안전한 설계와 투명한 운용이 더 현실적인 대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AI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양극화가 존재한다. 한쪽에서는 AI를 통제해야 할 위험물로, 또 한편에서는 만능 해결사로 여긴다. 그러나 AI가 일상에 스며들수록, 그 영향력은 ‘비범함’이 아닌 ‘평범함’ 속에서 드러난다.
윤리적으로도 AI는 인간의 통제와 책임,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를 동반한다. AI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기보다, 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차별·오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
AI의 ‘정상화’는 기술의 위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일상적 관리와 토론의 대상에 두는 데서 시작된다. 실제 사례들은 AI의 일상성을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음성비서, 넷플릭스의 추천 시스템, 병원의 진단 지원 AI 등은 이미 우리의 선택과 경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구글의 AI 검색,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등은 복잡한 기술이지만, 사용자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 도구다.
또한, Anthropic 등 글로벌 기업들이 AI 안전성 연구와 규제 준수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AI 오작동이나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도 있지만, 점진적 개선과 투명성 확보로 일상적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
AI가 ‘비정상적’ 기술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래에는 AI가 전기·인터넷처럼 ‘평범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
기술의 일상화는 두려움이 아닌 이해와 포용, 그리고 윤리적·사회적 책임의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는 AI를 특별한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가치에 맞게 설계·운용해야 할 ‘일상적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AI의 정상화는 결국, 기술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출발점이다.
태그: AI, 일상화, 기술철학, 윤리, 사회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