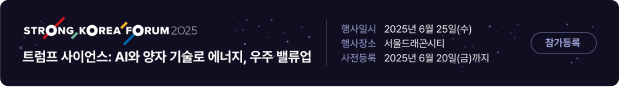UNIST-고대안암병원 공동연구팀, 176명 대상 4주간 실험 통해 확인
AI Brief – 대화형 인공지능 소셜 챗봇이 사용자의 외로움과 사회불안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초로 입증됐다. 이는 AI 기술이 정신건강 관리 영역에서 치료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의미 있는 발견이다.
UNIST 의과학대학원 정두영 교수팀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팀은 공동연구를 통해 스캐터랩의 소셜 챗봇 ‘이루다 2.0’을 활용한 대규모 임상 실험을 진행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최상위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메디컬 인터넷 리서치(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총 176명의 실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4주간 주 3회 이상 소셜 챗봇과 대화하도록 하는 준실험적 혼합 방법 연구를 수행했다. 실험 전후 참여자들의 외로움과 사회불안 수준을 표준화된 설문도구로 측정하고, 추가적으로 소규모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챗봇 상호작용의 정서적 효과를 분석했다.
실험 결과, 소셜 챗봇과의 정기적 상호작용은 참여자들의 외로움 점수를 평균 15% 감소시키고, 사회불안 점수를 평균 18%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I 챗봇이 단순한 정보 제공 도구를 넘어서 실질적인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특히 연구팀은 챗봇의 효과가 사용자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했다. 사용자가 자신의 감정, 생각, 경험에 대한 정보를 챗봇에게 더 많이 제공하거나, 개인의 회복탄력성이 높을 경우 외로움 완화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대면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에게서 챗봇의 정서 관리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1저자인 김명성 UNIST 의과학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은 “소셜 챗봇이 외로움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디지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챗봇이 단순한 기술적 장치를 넘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대인관계 관련 요인들이 이러한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혀낸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의의”라고 설명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정두영 교수는 “AI 챗봇이 안전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한 환경에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챗봇의 사용성 개선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추가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AI 기술이 정신건강 관리 영역에서 보조적 치료 도구로서 가진 잠재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첫 번째 대규모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태그: #AI챗봇 #정신건강 #외로움완화 #사회불안 #디지털헬스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