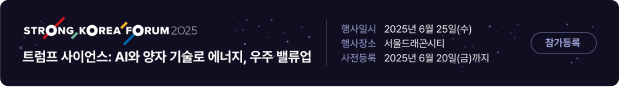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보조하는 강력한 도구로 각광받고 있지만, 오히려 인지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담긴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받고 있다. 최근 공개된 한 논문에 따르면,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LLM)을 사용해 글을 쓴 사람들은 뇌 신경, 언어, 행동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랩(Media Lab) 연구원들이 주도한 이 연구는 5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챗GPT(LLM) 사용 ▲구글 검색 사용 ▲도구 미사용(자신의 뇌만 사용) 조건에서 에세이를 작성했다. 연구진은 이 과정에서 뇌파측정(EEG) 장비로 참가자들의 뇌 신호를 기록하고, 키보드 입력과 최종 결과물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챗GPT를 사용한 그룹은 세 집단 중 뇌의 신경 연결성이 가장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과제 수행 중 인지적 관여도가 낮아지고 자각 능력이 감소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아무런 도구 없이 자신의 뇌만 사용한 그룹은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뇌 네트워크 활성화를 보였으며, 검색 엔진을 사용한 그룹은 그 중간 수준의 참여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신경학적 차이는 행동 및 언어 능력의 차이로도 이어졌다. 챗GPT 사용자들은 자신이 작성한 에세이에 대한 저자 의식(ownership)이 가장 낮았으며, 심지어 자신이 쓴 문장을 정확히 인용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AI가 생성한 텍스트에 의존하면서 자신의 사고 과정과 결과물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을 ‘인지적 빚(Cognitive Debt)’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AI가 제공하는 즉각적인 편리함 뒤에 숨겨진 잠재적 비용을 지적했다. AI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글을 쓰는 연습 시간을 갖는 것이 기억 회로를 보호하고, 더 풍부하고 독창적인 언어 표현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연구는 강조한다.
이번 연구는 AI 도구, 특히 생성형 AI에 대한 의존이 장기적으로 교육 및 학습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AI가 생성한 정보에만 의존하는 정보 루프(information loop)에 갇히게 될 경우, 인간 고유의 비판적 사고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퇴화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AI의 발전이 인간 지능의 ‘대체’가 아닌 ‘증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화두를 던진다. 기술의 편리함에 안주하기보다, AI와 협력하면서도 인간 고유의 지적 능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차원의 깊이 있는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